고전산책- 우물안 개구리 바다를 의심한다.
페이지 정보
김영환 작성일15-11-23 14:50 조회2,125회 댓글0건본문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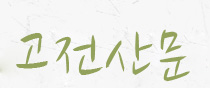 |
- 사백두 번째 이야기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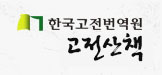 |
| 2015년 11월 23일 (월) |
|
|
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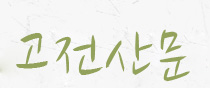 |
- 사백두 번째 이야기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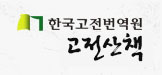 |
| 2015년 11월 23일 (월) |
|
|
|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